신미경 시인은 정격시조 형식을 지켜 단시조 창작에 집중하는 시인이다.
그의 첫 시조집 「아버지의자전거」에 수록된 103편은 모두 단시조의 음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초장과 중장 공히 3434를 적용하고 있으며 종장 역시 3543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시조는 아기자기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계절의 풍경과 조화를 이뤄 시조를 통해 알려준다.
흡사 이야기를 나누는 듯 편안한 시어들이 정겹기까지 한데 그 자수들이 단시조 혹은 연시조의 틀에 정확히 맞추어 있다는 것이 세삼 놀랍기까지 하다.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간결한 시를 읽는다고 착각할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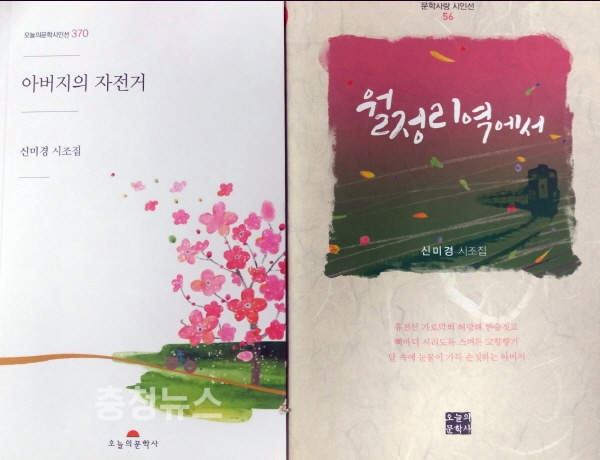
「아버지의 자전거」 시조집에는 단시조가 89편, 연시조가 1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순수한 마음을 지향하는 신미경 시인은 2009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해 꾸준히 작품을 빚어 여러 지면에 발표한다.
시인은 「문학사랑」에서 제정한 ‘인터넷문학상’을 수상(2014년)하고 「시조문학」에서 제정한 ‘올해의 시조문학 작품상’을 수상(2016년)하였으며 2017년 한밭아동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뛰어난 작품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신미경 시인의 시조에는 아버지에 대한 회한이 깃든 시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의 평강군으로 강원도 철원군의 북쪽과 닿아 있어 지척이지만 오갈 수 없는 지역이어서 시인의 아버지는 실향의 애끓는 정서를 삭히며 한 평생을 사셨다.
고향지명 ‘평강’을 잊지 않기 위해 어린 딸인 시인의 별명을 ‘평강공주’라 지어 부를 만큼 고향을 그리워하였다. 명절이면 간소한 제수를 마련해 고향과 가까운 철원군 월정리역을 찾아 제사를 지냈는데 시인도 어릴 적 여러 번 동행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월정리역은 깊은 사연이 있는데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지판을 세우게 한 바로 그 기관차에서 근무하다 산화한 조부를 그리워한 아버지의 정서는 시인에게로 전이되어 정서적 통증을 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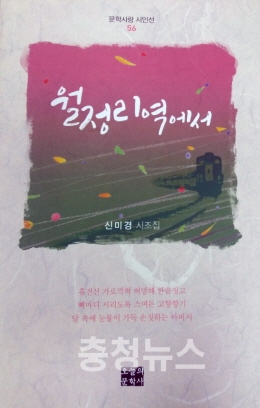
두 번째 시조집 「월정리역에서」의 출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았나 싶다.
시인의 부친은 평생 휴전선과 월정리역을 찾아 부친을 추모하셨다. 또한 시인의 부친은 구국의 일념으로 조국통일을 기원하던 국군 신분이었으며 작고하여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다.
신미경 시인도 아버지를 이어 조국분단에 의한 ‘통한의 정서’가 내면화된 듯하다.
큰소리 외치면서
민통선 드나들다
휴전선 앞에 서서
북녘 땅 바라보는
녹이 슨 분단의 아픔
멈추어 선 철마야
폐역 된 월정리 역
잠이 든 기적소리
독수리 넘나들며
물고 온 고향 향기
민통선 봉우리 밟고
넘어가는 구름아
-「월정리역에서」 (서시,전문)
신 시인의 ‘의식의 프리즘’으로 또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다.
몇 편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비판의식은 그를 ‘깨어 있는 시인’으로 인식하게 한다. 촛불집회의 본부였던 「광화문」에서 <촛불은/ 하나가 되어 / 어둔 세상 밝힌다.> 고 의미를 부여한다. 정치가들의 오류를 확인하는 「왕새우, 특검」에서 <(국정) 농단에 / 찢어진 마음/ 민정시찰 나섰다.>고 그려낸다. 광화문 「집회」에 대하여 <함성을 내지르면/ 희망을 노>를 젓는다고 비유한다. 이와 함께 정치적 이슈나 개인적 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다의적 함수를 지닌 작품 「믿는 도끼」와 같은 작품도 여러 편 빚어내고 있다.
신미경 시인은 「아버지의 자전거」, 「월정리역에서」 두 시조집을 통해 때론 감성 풍부한 여성으로서 작고 섬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표현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주옥같은 시조 들을 빚어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을 부친을 향한 그리움으로 투영해 현실의 북한과 처해있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속의 현세대에게도 다시금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시조임에 충분하다.
한편 신미경 시인은 현재 대전시조시인협회 감사, 한밭아동문학가협회 이사, 가람문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성배울초등학교, 문정중학교, 송촌중학교, 동아마이더스고등학교 등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시조 짓기를 재미있고 신나게 지도하고 있다.


